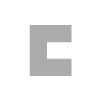자유부인
추선진이 엮은 정비석의 ≪자유부인≫
이번 한 번만
오선영의 남편은 장태연이지만 지금 앞에 있는 남자는 한태석이다. 남편은 일상이지만 남자는 도전이다. 일상은 우리를 보전하지만 도전은 우리를 추동한다. 인간은 보전과 추동의 동물이다. 본질 앞에 존재가 있다.
“여편네하고 춤을 추느냐고요? 차라리 절구통을 안고 지랄을 부리는 게 낫지, 미쳤다고 그런 발광을 부리겠읍니까!”
“호호호 뭐가 그러실라구요. 그래도 부인을 무척 사랑하시는 모양이던데…”
오 여사는 스텝을 밟고 돌아가며 간드러지게 웃었다.
“사랑인지 안방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춤이라는 걸 집에서는 추어본 전례가 없읍니다.”
한태석은 오 여사를 껴안은 채, 신바람이 나게 스텝을 밟고 돌아가면서 말하였다.
“부인도 춤을 잘 추신다는데, 댁에서는 왜 안 추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절구통을 껴안고 지랄을 부리는 게 낫지, 우리 집 안잠자기 같은 것하고 춤이 무슨 춤입니까. 땐스라는 것은 일종의 문화 향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집 안잠자기는 원체 교양이 없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걸요!”
오선영 여사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대답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서
“아이참, 교양이 없기는 저도 마찬가지죠 머!”
하고 한마디 더 걸어 잡아당겼다. 일종의 유도 전술(誘導戰術)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한태석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건 너무나 겸손의 말씀입니다. 나도 여자를 많이 대해보았지만, 오 마담을 대할 때면 일종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걸요.”
“선생님두!… 향기가 무슨 향기겠어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교양의 향기라고 할는지, 뭐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 마담을 대하면 향기로운 꽃을 대했을 때처럼 내 정신조차가 향기로워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엉터리없는 수작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말은 오선영 여사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오 여사는 교양의 향기를 풍기기 위하여, 의식적인 애교조차 부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애교가 즉 교양이라고 생각했던지도 모를 일이다.
레코오드가 끝나는 바람에 땐스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한태석은 오선영 여사를 놓아주는 대신에, 왼편 팔마저 슬며시 여자의 허리를 돌려 안으면서
“마담!”
하고 은근히 부른다.
깨닫고 보니, 한태석의 그윽한 시선이 오선영 여사의 얼굴에 부어지고 있었다. 밤의 흥분이 넘치는 시선이었다. 언젠가 신춘호가 마담! 마담! 하며 졸라대던 때의 시선과 흡사한 시선이기도 하였다.
오선영 여사는 미리 각오한 바 있었기에,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느나, 가슴만은 몹시 두근거렸다.
“마담!”
다시 부르며 몸을 약간 흔드는 바람에, 오 여사는 저도 모르게 눈을 실낱같이 가늘게 뜨며 한태석의 얼굴을 그윽히 올려다보았다. 무엇이든지 요구대로 듣겠다는 표정이 분명하였다. 혹은, 자진해서 무엇인가를 갈구하여 마지않는 동물 본연의 표정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마담! 마담의 얼굴은 마돈나의 얼굴같이 순결하고도 성스럽구려!”
한태석의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꿈결같이 들려왔다. 무아경(無我境)의 일순간이었다.
다음 순간, 한태석의 얼굴이 자기 얼굴에 겹쳐옴을 느끼자, 오선영 여사는 저도 모르게 사나이의 어깨를 살며시 붙잡으며 눈을 사르르 감았다. 눈만 감으면 그만이었다. 입술과 입술이 마주 닿았다.
황홀한 감각이었다. 입술에서 오는 황홀한 감각이 전신에 전파처럼 퍼져나갔다. 아니, 전신이 송두리채 입술로 변해버린 듯, 오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은 오직 입술의 감각뿐이었다.
“자, 저 방으로 가십시다.”
저 방이란−떠불·벳드가 놓여 있는 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태석은 여자의 몸을 옆으로 살며시 껴안더니, 한걸음 한걸음 조심성스럽게 걸어 나간다.
오 여사는 어느 아득히 먼 곳에서 웨ᐨ딩, 마ᐨ취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을 느끼며, 꿈속에서 걸음을 옮겼다.
오선영 여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을 때마다 웨ᐨ딩·마아취 소리가 점점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바람결에 풍겨오는 풍악 소리 같기도 하였고, 혈관을 통하여 전신에 흘러드는 물결 소리 같기도 하였다. 십여 년 전에 장태연 교수를 남편으로 맞이하려고 웨ᐨ딩·마아취에 발을 맞추어 결혼식장으로 걸어가던 때와 흡사한 심정이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상대가 한태석이라는 점뿐이었다.
상대자가 다르다는 것은 안 될 말이었다. 그러기에 오선영 여사는 눈을 감았다. 눈을 뜨면 상대자의 얼굴이 보여서 양심의 가책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지만, 눈만 감으면 그만이었다. 눈을 뜨면 양심의 구속을 받게 되지만 눈만 감으면 그다음은 자유의 세계였다. 그러므로 해서 ‘그저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아주십시오’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한태석이가 오 여사를 떠불·벳드로 안동해 오는 그 시간에, 유리창 밖에서 방 안을 엿보고 있는 분노의 얼굴이 있었다. 이미 그들이 이 방에 들어오던 그 시간부터 그들을 노려보고 있는 질투와 증오의 시선이었다.
그런 사실을 알 턱 없는 한태석은 여왕을 모시는 내시처럼 오선영 여사를 조심스럽게 벳드로 인도하였다. 한태석은 내시의 복면을 쓴 강도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침대 언저리가 다리에 부딪치는 바람에 오선영 여사는 제물에 눈을 반짝 떠보다가,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몸과 마음의 준비는 벌써부터 다 되어 있지만, 휘황한 광선이 양심의 눈에 부시었던 것이다.
“불, 끄세요!”
오선영 여사는 무심중에 중얼거렸다.
“불을 꺼요?”
한태석이가 약간 불만한 어조로 물었다.
“꺼주세요.”
“그럼 끄죠!”
팔을 들어, 전등 스윗지를 막 끄려고 했을 그 순간이었다. 벼란간 벼락 치는 소리로 문이 열리며, 누구인가 비호같이 방 안으로 튀어들더니, 댓바람에 오선영 여사의 머리채를 휘어쥐고 우박같이 주먹을 내리족치면서
“이 화냥년아! 이년아! 네년이 가겟돈을 야금야금 훔쳐먹더니, 이제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남의 서방까지 빼앗아 먹는단 말이냐, 이년아! 이 ×가랭이를 찢어 죽일 천벌을 받을 년아!”
하고 방 안이 떠나갈 듯이 지랄 발광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월선 여사의 날벼락이었다.
이월선 여사는 아까 정거장에서 오선영 여사를 힐끗 발견한 그 순간부터 수상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뒤를 밤새 미행했던 것이다.
한태석이가 당황히 덤벼들어 뜯어말리려 하였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이 우라질 년아! 멀정한 서방을 가진 년이 무엇이 부족해서 남의 서방까지 빼앗아 먹는단 말이냐! 이년아! 이 배라먹을 개 같은 화냥년아!”
이월선 여사는 게거품을 한입 물고, 길길이 날뛰면서 오선영 여사에게 마구 덤벼들었다. 오선영 여사는 숫제 죽은 목숨이었다.
방 안은 일대 수라장을 이루었다. 이월선 여사는 남편과 오 여사를 닥치는 대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가진 악담을 다 퍼붓는다.
떠드는 소리에 놀라, 주인 방과 손님방에서 사람들이 자다 말고 우루루 몰려왔다. 여럿이 덤벼들어 가까스로 떼어놓았으나, 이월선 여사는 미친 여자처럼 머리채를 풀어 헤친 채 오선영 여사에게 아글바글 대어들었다.
“이년아! 네년이 오래전부터 꼬리를 치는 줄은 알았지만, 이제야 붙잡았구나,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리같이 사납게 덤벼들었다.
“빨리 도망을 가요! 빨리!”
모두들 도망을 가라는 바람에 오 여사는 정신없이 밖으로 달려 나왔다. 옷고름이 풀어지고 머리채가 흩어졌으나 그런 것을 돌아볼 계제가 아니었다.
비참한 신세였다. 천망(天網)이 회회(恢恢)나 소이불루(疎而不漏)라는 말이 있다.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던 여자로서는 당연한 천벌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유부인≫, 정비석 지음, 추선진 엮음, 176~182쪽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