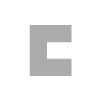천국으로 가는 길
김재선이 옮긴 후안 마요르가(Juan Mayorga)의 ≪천국으로 가는 길(Himmelweg)≫
기억하지 않는 과거는 반복된다
모든 것은 지금이고 여기서 벌어진다. 과거나 미래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은 오직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만 지금, 여기일 수 있다. 역사가 아니면 인간도 아니다.
우리는 고트프리트가 묵는 막사까지 동행합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라고 고트프리트는 말합니다. 사령관과 저는 붉은색 벽돌로 된 그 막사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뒤를 돌아봅니다. 고트프리트가 아주 그윽하게 바라봅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은 압니다. “저기, 살아 있는 사람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령관은 차까지 저를 안내하는 내내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독일은 굉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유럽은 우리가 한 일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미 고트프리트에게 들으셨죠,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베를린에 도착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매일 밤 제 기억은 그 보고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화장터 못 봤어?” “기차 못 봤어?” 못 봤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못 봤습니다. “연기는?” “재는?”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고 말하는 것들을 저는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가끔 고트프리트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질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강가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그 소녀에게 질문할 수도 있었다고. 그 소녀는 알았을 테니까요. 재는 강에 뿌려졌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땅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누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까요? 지금이라면 쉽게 저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제가 그때 여기,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후안 마요르가 지음, 김재선 옮김, 20∼21쪽
‘저’는 누구인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강제수용소를 방문했던 한 적십자 대표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그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가?
강제수용소에서 가스실로 가는 길을 독일어로 ‘히멜베크(Himmelweg)’,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불렀다.
적십자 대표는 그때, 거기서 무엇을 보았나?
화장터도, 재도, 연기도 보지 못했다. 고트프리트라는 유대인 시장은 아스팔트가 깔린 깨끗한 길로 그를 안내했다. 광장 휴게실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공원에는 색색 풍선이 가득했다. 줄무늬 죄수복을 입은 비쩍 마른 사람들 대신 잘 차려입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딘가 어색한 자동 인형 같았다.
어색한 자동인형은 누가 만든 작품인가?
사령관의 각본이다. 팽이 치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대화하는 연인, 강가에서 인형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소녀는 모두 연극에 동원되었다.
가능한 일인가?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적십자 대표 또한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적십자 대표는 보고서에 뭐라고 썼나?
보이는 것을 썼다. 허위는 아니었지만 사실도 아니었다. 가해자와 희생자, 관찰자 모두가 진실을 숨긴 셈이다.
범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희생자이며 희생자인 동시에 가해자다. 프리모 레비가 말한 ‘회색지대’ 사람들이다. 역사 현장에서, 각자가 놓인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이다. 그들을 선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무고하지만 무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가?
역설이 성립한다. 진실을 직시하는 데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인간 절멸이라는 지옥 같은 현실에 맞서지 못한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사령관, 유대인 시장, 적십자 대표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모습이다. 마요르가는 극에서 다룬 역사가 독일과 유대인의 문제로, 혹은 이미 끝난 일로 간과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 번 일어난 일은, 특히 기억하지 않는 과거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관심과 비겁함으로 끔찍한 현실에 가면을 씌우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마요르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인간의 작고 나약한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공포, 희생자들이 행하는 조작, 폭력 앞에서 누구나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감, 문명 또는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야만성 외에도 얽히고설킨 연극과 인생의 상관관계를 이 작품에서 다뤘다. 그는 서문에서 독자와 관객, 연출과 배우들이 최소한 이런 주제를 발견했으면 한다고 썼다.
희곡은 이 부담스런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학살의 참상을 직접 전하거나 희생자 또는 가해자 일방의 입장에서 극을 끌어 가지 않고, 실제로 있었을지도 모를 사건에 연극적 상상력을 더해 한없이 나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잔인한 부조리한 인간상을 선보였다.
국내에 네 번째로 소개하는 마요르가 작품이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철학 하는 연극이라는 점이다. 마요르가는 연극이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 외에도 관객이 삶과 세계를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작가들은 사고에 몸을 입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며 꾸준히 철학 하는 연극을 선보이고 있다.
철학자인가?
1997년에 발터 베냐민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마드리드와 근교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수학처럼 정확한 극 언어를 추구하는 것도 이런 이력을 증명한다.
마요르가에 대한 평판은 어떤가?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극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마드리드왕립드라마예술학교 교수로 있으며 2011년에 창단한 극단 ‘라로카 데라카사(La Loca de la Casa)’에서 연출과 극작을 겸하고 있다. <다윈의 거북이>, <하멜린> 외 작품 다수가 막스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물론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등 25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소개되고 있다. 2012년에는 그의 희곡 <마지막 줄 소년>을 프랑수아 오종 감독이 영화화해 산세바스티안영화제, 토론토영화제에서 입상했다.
한국과 인연은?
2009년 <다윈의 거북이>가 김동현 연출로 서울에서 공연했을 때 한국을 방문해 자신의 연극론을 강연했다. 그 뒤 <영원한 평화>, <하멜린>, 최근 <천국으로 가는 길>까지 그의 작품이 공연·출판되고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김재선이다.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에서 스페인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한국외대에 출강한다.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