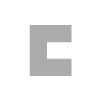난중일기
난중일기 2. 듣도 보도 못했던 <<난중일기>> 등장
왜 읽지 않았을까?
현충사에도 가보고 통영에도 가보고 영화도 보고 소설도 보았지만 그의 일기는 읽지 않았다. 남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의 이
야기를 직접 듣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볼만한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 책은 볼만한지 만든 사람에게 물었다.
이것이 이순신의 일기, <<난중일기>> 맞는가?
이순신이 쓰고 이은상이 옮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이다.
내용을 고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원본 그대로다.
그러면 보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원본 그대로다.
그런데 어떻게 894쪽이나 되는가?
읽기 좋게 글줄을 앉혔기 때문이다.
두꺼운데 가볍다. 무슨 장치를 한 것인가?
재생지를 사용했다. 두께를 유지하면서 무게는 가볍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눈부심 없이 읽을 수 있다.
책장이 힘없이 넘어가는 이유는 뭔가?
매우 질긴 접착제를 사용해 책장을 묶었기 때문이다. 보통 책보다 3배 정도 강하게 책장을 움켜쥔다.
글을 가로 쓰지 않고 내려 쓴 이유는 뭔가?
원문의 구성을 따른 것이다. 내려 쓰지 않으면 답답해서 읽기 힘들다.
글줄이 자주 꺾여 올라간 이유는 뭔가?
작가의 내재율과 독자의 호흡 리듬을 맞추기 위한 장치다. 글을 틀리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사용한 글자체가 낯설다. 이름이 뭔가?
아시아펜글씨체다. <<난중일기>>의 내용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획을 북돋우고 각을 조정하고 길이를 맞추었다.
그 글자체가 아닌 듯싶은데?
많은 변형이 있었다. 작업이 끝났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달라졌다. 다른 글자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본문 아래로 끊임없이 지나가는 바다와 배는 무엇인가?
이 책의 배경이다. 바다가 있고 바람과 비가 있다. 우리 배와 적의 배가 만나고 헤어진다. 7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 책에 사용된 붉은 색은 무엇을 뜻하는가?
피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다. 이 장군의 칼에 새겨진 글자를 생각했다.
무슨 글자였는가?
일휘소탕 혈염산하다.
무슨 말인가?
한번 칼을 빼 적을 베니 피가 세상을 물들인다는 뜻이다.
그런 잔인한 뜻이었단 말인가?
그는 군인이다. 군인에게 칼이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표지에는 왜 검은 산들만 첩첩한가?
남쪽 바다의 섬들이다. 낮엔 밝고 밤엔 어둡다. <<난중일기>>에 나타나는 바다는 검은 섬들일 뿐이다.
검은 섬이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난중일기>>의 작가에게 세상은 삶과 죽음을 나눌 수 없는 숙제였을 것이다.
그런 무거운 내용을 이렇게 작은 판형에 담을 수 있는가?
내용이 무겁다고 책이 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크기는 우리 인간의 뇌와 심장의 용적을 합친 정도의 크기다.
<<난중일기>>는 여러 판본이 있다. 이 책은 어떤 것인가?
1960년대 이은상이 당시 한학 전문가들과 함께 옮긴 책이다. 1950년대 홍명희의 아들이 옮긴 것도 있다. 그 뒤에 출간된 많은 판본들은 대개 이 두 판본을 감역하고 전문 지식을 보탠 것이다.
이은상 초판을 그대로 출판한 것인가?
초판 이후 발견된 사실은 보태 넣었다. 초판에서 표기가 잘못된 채 전해진 것은 고쳤다. 날짜 표기 방법은 순우리말로 다시 썼다. 지명이 많이 등장해 정리해 넣었다.
많이 달라진 것인가?
<<난중일기>>는 <<난중일기>>다. 우리가 이번에 한 일은 옛날 글을 요즘 책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난중일기>> 출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읽혀지는 <<난중일기>>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있던 판본은 읽혀지지 않았다는 말인가?
읽기 힘들었다.
이 책의 디자인 콘셉트는 뭔가?
작가 이순신의 심상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가운데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가?
물론 변한다.
뭘 확인한다는 것인가?
생명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송성재다. 호서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다.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