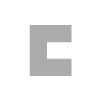윤동주 시선 초판본
시집 신간, <<초판본 윤동주 시선>>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다
윤동주의 시는 유명하다. 어렵지 않고 길지도 않지만 읽다 보면 마음속에서 뭔가 조용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의 시가 자신의 허물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에 대한 고백의 양식이라는 설명도 낯설지 않다. 그러나 우리 모두와 관계된 그 부끄러움을 그처럼 깊이,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무엇인가?
윤동주의 독창성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함으로써 부끄러움의 미학을 확립했다. 이런 시인은 드물다. 그래서 독보적이다. 민족의식과 기독교 신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부끄러움의 미학이란?
그의 시가 나타내는 참회의 고백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인식하고 고백한다.
허물의 인식이 특별한 현상인가?
그는 실존적 자아의 가치가 하락하는 내면적 고통을 체험한다. 그렇지만 허물을 인식하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 심미적·윤리적인 자기 정체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 허물 인식을 통해 부끄러움의 미학을 확립한다.
기독교 신앙은?
그의 시를 형성하고 있는 토대이자 세계관이다.
어떻게 나타났나?
그의 시에서 고백은 기독교 성경에서 비롯된 언어로부터 형성되고 있다. 고백은 기독교 성경과의 알레고리에 의해 형성된 희생 제물의 제의적 상징들과 참회자가 토설하는 속죄 고백의 언어적 특성들을 나타낸다.
기독교는 어떻게 그의 안으로 들어왔을까?
북간도로 이주하면서 기독교에 입문했던 그의 친가와 외가의 영향을 받았다. 태어나서 자랐던 기독교 마을 명동촌, 그가 다녔던 기독교계 학교에서 그와 기독교의 관계를 찾을 수 있다.
기독교와 민족정신은 어떻게 만났나?
윤동주는 식민지 청년 지식인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증조부 때부터 북간도로 이주해서 살아온 실향민 후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어려서 유아세례를 받고 자라면서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신앙인의 정체성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정체성이 그가 민족정신과 기독교 신앙이 조화를 이룬 고백의 시학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근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 시를 썼을까?
시 쓰기를 통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고백함과 동시에 일제 치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민족과 자기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고자 했다.
민족시인인가?
자선 시집의 제목을 ≪병원≫으로 하려고 했을 만큼 일제 치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치유와 위로의 심정이 간절했다. 그의 시는 읽는 이로 하여금 일제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십자가>를 보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고자 했던 그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속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면, 시적 화자는 민족을 위한 속죄의 희생양이 되고자 한다. 자신에게도 운명적인 “十字架가 許諾된다면”, 자신의 생명의 상징인 “꽃처럼 피여나는 피”를 민족의 구원을 위한 제단에 바치겠다고 결심하며 비장한 심정으로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동주 시집은 많다. 이 시선은 뭐가 낫나?
친필 원고 표기를 독자들이 그대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친필 원고의 표기와 1948년과 1955년에 나왔던 유고시집의 표기를 각주를 통해 비교해 놓음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풍부한 각주와 주해를 담고자 노력했다.
독자가 그를 옳게 만나는 방법은?
시인이 자신의 골방에서 일구어 낸 고백의 시어를 당시 표기 그대로 피부로 느끼면서 감상하길 바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시대적 아픔과 함께 개인적으로 내밀한 상처를 지니고 있다. 그의 시를 통해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대우교수 노승욱이다.
시 한편을 고른다면?
<쉽게 씨워진 詩>다. 자신의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을 부끄러워한 역설적인 고백을 보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 못한 나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의 고백을 일구어 낸 시인이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자기 자신을 위안하는 악수를 스스로에게 청하는 모습을 볼 때는 그저 한없이 숙연해질 따름이다.
쉽게 씨워진 詩
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六 疊 房은 남의 나라,
詩人이란 슬픈 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詩를 적어 볼가,
땀내와 사랑내 포그니 품긴
보내 주신 學費 封套를 받어
大學 노−트를 끼고
늙은 敎授의 講義 들으려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沈澱하는 것일가?
人生은 살기 어렵다는데
詩가 이렇게 쉽게 씨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六 疊 房은 남의 나라.
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곰 내몰고,
時代처럼 올 아츰을 기다리는 最後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慰安으로 잡는 最初의 握手.
1942. 6. 3
≪초판본 윤동주 시선≫, 윤동주 지음, 노승욱 엮음, 38~39쪽.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