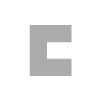책소개
조선 전기에는 개경의 여러 지역을 두루 구경하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특히 채수나 유호인 등은 사가독서(賜暇讀書, 채수의 <유송도록>의 주4 참조)의 기회를 얻어 개경을 가는 경우였는데, 여행 기간도 길면서 이동 거리 역시 상당히 길게 나타난다. 조선의 개국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대부들이어서 그런지 이들의 글에는 벼슬아치로서의 자부심이나 여행의 즐거움이 작품 전체에 한껏 배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흥겨운 여행 분위기가 고려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면서 철저히 유학자적인 입장으로 바뀌는데, 그 대표적인 글이 바로 생육신의 한 사람이기도 한 추강 남효온의 글이다. 즉 남효온의 글에는 유학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배제될 법한 괴력난신의 이야기나 남녀가 함께 어울려 노는 당시 풍속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서도 그러한 풍습이나 이야기를 바라보는 태도는 아주 비판적이다. 한마디로 남효온의 글은 착한 모범생이 옳지 못한 장소에 갔을 때 자신의 도덕적 입장이 더 크게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글의 특징을 개인적인 성격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조선 전기를 넘어서면서 성리학이 사대부들의 내면으로 서서히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조선의 산하와 풍속들에 대해 성리학적 입장에서 새판을 짜 가는 과정인 셈이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개경은 일종의 유학적 성지(聖地)로 부각된다. 이러한 변신은 조선조에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일로 조선 중기 이후 개경의 기행문을 보면 포은 정몽주나 화담 서경덕의 흔적이 깃든 곳인 선죽교나 화담 등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이 두 인물이 개경의 여행 코스에 자주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573년(선조 6)에 이들을 모시기 위한 숭양서원(崧陽書院)의 건립인 것 같다.
그러나 조선의 전후기를 가릴 것 없이 빼어난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연폭포를 찾았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 박연폭포를 필수 코스로 삼는 까닭으로 뛰어난 풍경 말고도 큰 힘 들이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개경 여행은 박연폭포 찾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글들은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가운데 채수의 ≪나재집(懶齋集)≫ 권1, 유호인의 ≪뇌계집(㵢溪集)≫ 권7, 남효온의 ≪추강선생문집(秋江先生文集)≫ 권6, 조찬한의 ≪현주집(玄洲集)≫ 권15상, 김육의 ≪잠곡선생유고(潛谷先生遺稿)≫ 권14, 김창협의 ≪농암집(農巖集)≫ 권23, 오원의 ≪월곡집(月谷集)≫ 권10에서 뽑아서 번역한 것이다.
200자평
고려의 500년 도읍지로 유서 깊은 문물을 간직하고 있는 곳 개성.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곳을 어떻게 보고 느꼈을까? 우리가 북한 금강산 유람을 간 기분일까? 문장으로 이름 높은 여러 선비들의 문집에서 개성 여행기만 뽑아 엮었다. 만경대, 선죽교, 박연폭포 등 개성의 여러 볼거리들을 코스별로 소개하는가 하면, 동경과 우월감, 호승심, 비판 정신 등 사람에 따라 같은 곳에 대한 감상과 표현도 가지각색이라 이를 비교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지은이
채수는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인천(仁川), 자(字)는 기지(耆之), 호(號)는 나재(懶齋)다. 1468년(세조 14)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에 장원해 사헌부감찰이 되었다. ≪세조실록≫, ≪예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1703년(숙종 29) 함창의 사림들에 의해 임호서원(臨湖書院)이 건립되면서 표연말(表沿沫), 홍귀달(洪貴達) 등과 함께 그곳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나재집≫이 있다. 좌찬성에 추증되고, 시호는 양정(襄靖)이다. 그는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산경(山經), 지지(地誌), 패관소설(稗官小說)에까지 해박했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또한 산수를 좋아해 삼각산, 금강산, 지리산, 팔공산, 가야산, 비슬산, 황악산, 속리산 등의 정상을 두루 올랐다고 한다. 만년에는 서울의 남산 밑에 집을 짓고 인공으로 폭포를 만들어 놓고 눈과 귀, 입을 즐겁게 한다는 ‘폭포 삼락(瀑布三樂)’을 즐기기도 했다.
옮긴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다. 저서로 ≪손곡 이달 연구≫(공저), ≪장서각 수집 고서 해제≫(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 <박연폭포 시에 대한 일고찰>, <주몽신화(朱蒙神話)의 천문신화학적 연구> 등이 있다.
차례
유송도록(遊松都錄)
유송도록(遊松都錄)
송경록(松京錄)
유천마성거양산기(遊天磨聖居兩山記)
천성일록(天聖日錄)
유송경기(遊松京記)
서유일기(西遊日記)
해설
옮긴이에 대해
책속으로
1.
웅덩이 물이 넘쳐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데, 마치 은하수가 거꾸로 걸린 듯하다. 폭포는 구슬 같고 눈발 같은 물방울을 뿜어내고 휘날리면서 바위 골짜기를 쾅쾅 울려 대는데, 그 소리는 마치 성난 우렛소리 같았다. 해괴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었다. 조물주의 재주가 이 지경까지 이를 줄이야! 혹시라도 와 보지 못했다면 항아리 속 초파리 꼴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휘어진 소나무들이 비탈을 따라서 거꾸로 드리워져 있었다. 따라온 종자(從者)들이 원숭이처럼 소나무에 붙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머리칼이 솟고 정신이 떨려 가까이 하지 못했다. 돌 위에는 이곳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새겨져 있었다.
2.
4일(경오). 적전판관(籍田判官) 정서가 찾아와 함께 화원으로 향했다. 화원은 공민왕 23년에 세웠다. 팔각전에 있는 옥좌에는 먼지가 뽀얗게 끼었고, 창살에는 거미줄이 얽혀 있었다. 계단 아래에 있는 앵두나무 수십 그루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팔각전 뒤에는 괴석(怪石)으로 산을 만들어 놓고, 진기한 꽃들을 돌 틈에 가득 심어 놓았다. 이는 우왕이 임금 자리를 도적질한 10여 년 동안 즐기던 풍경이건만, 지금은 민가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참으로 사람이 잃고 얻는 것도 결국 이 티끌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미덥지 아니하랴.
도평의사(都評議司)를 지나서 서쪽 벽 움푹 들어간 곳에 석각(石刻)이 있었다. 삼봉 정도전이 지은 기문(記文)이다. 세 그루 회화나무가 허술한 곳을 채워 주고 있을 뿐 사방은 모두 쓸쓸했다. 어떤 사람은 충신이라고, 어떤 사람은 간신이라고 쓰여 있으니, 이 어찌 ‘살갗 밑에 춘추(春秋)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3.
박연폭포의 경치는 천하에서 뛰어나고 사해(四海)에 으뜸이니, 하나의 일이나 하나의 말로서 그 형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쪽 하박연의 검푸른 절벽은 칼로 깎아 세운 듯하다. 노을빛에 주름이 접히고 안개에 찢어진 듯하고, 담벼락이나 병풍을 우뚝 세워 놓은 듯도 하다. 높이는 거의 수백 길이 되고 넓이는 수백 걸음이 된다. 폭포수는 긴 부리 모양의 매끈한 길을 따라 쏟아져 내린다. 폭포는 부리 모양의 길을 따라 쏟아져 내리기도 하고 뿜어 오르기도 하면서 우렛소리 쾅쾅 울리고 번개를 치는 듯하다. 바야흐로 그 우람한 모습은 하늘이 열리며 노을이 떨어지는 듯하고 구름이 걷힌 뒤 용이 길게 걸려 있는 듯하다.
4.
한 마장쯤 가니 범림암(梵林菴)이었다. 이곳에서 잠깐 쉬었다. 다시 길을 꺾어서 세 마장쯤 올라가자, 보현봉과 문수봉 아래에 있는 적조암(寂照庵)이 나왔다. 이곳은 아주 높아서 열에 일고여덟 정도 되는 높이에 자리한 듯했다. 수많은 봉우리들이 빙 둘러서 화살처럼 서 있어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절을 하는 듯했다. 그 봉우리가 바로 천마봉, 나월봉, 노적봉, 원적봉, 법주봉, 청량봉이다. 봉우리 하나하나가 높이 솟아 있어 마치 옥비녀를 꽂아 놓거나 푸른 연꽃을 심어 놓은 듯했다. 참으로 산의 진면목이 여기에 몽땅 모여 있었다. 아직 금강산의 정양사(正陽寺)에 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보다 낫지는 못할 것 같았다. 암자가 뛰어난 경치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법당 또한 지극히 깨끗해 한 점 티끌이 붙어 있지 않았다.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일을 제쳐 두고 열흘쯤 여기에 앉혀 둔다 해도 이런 풍경을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았다.

 commbooks@commbooks.com
commbooks@commbooks.com  02.7474.001
02.7474.001  02.736.5047
02.736.5047